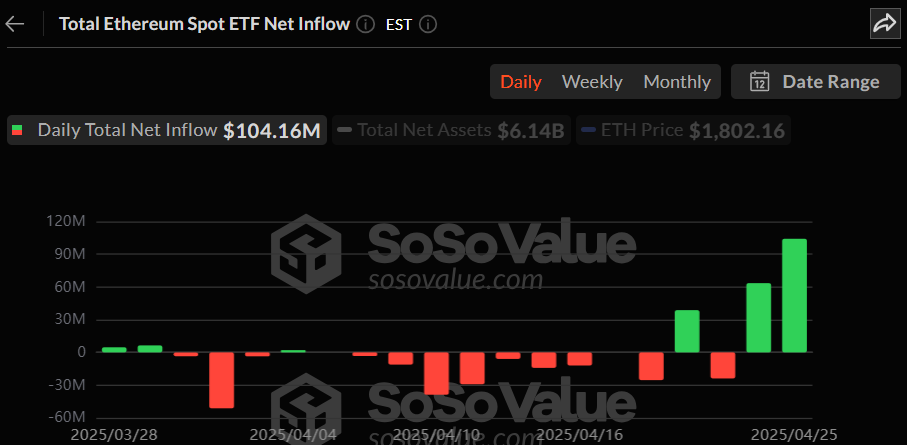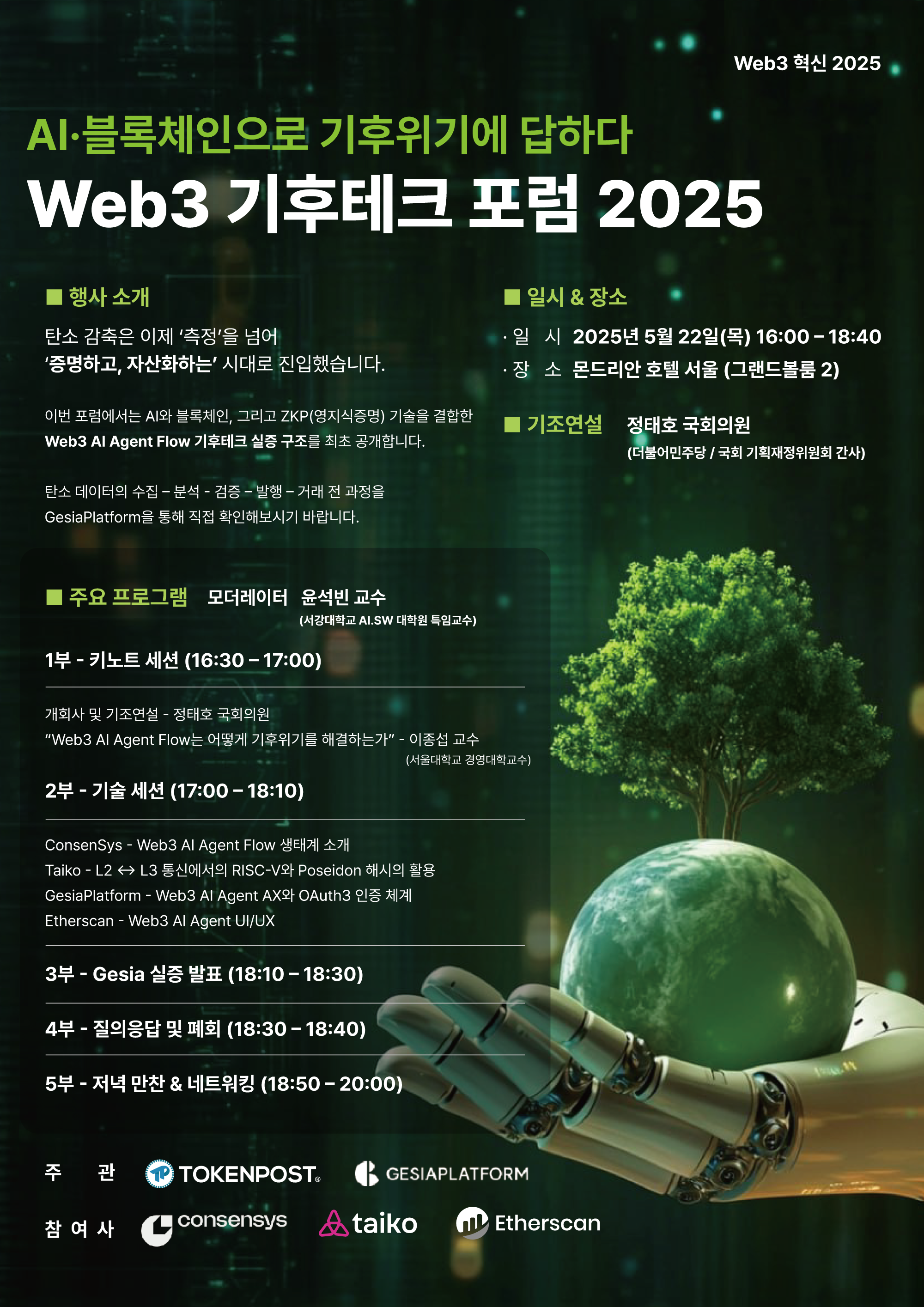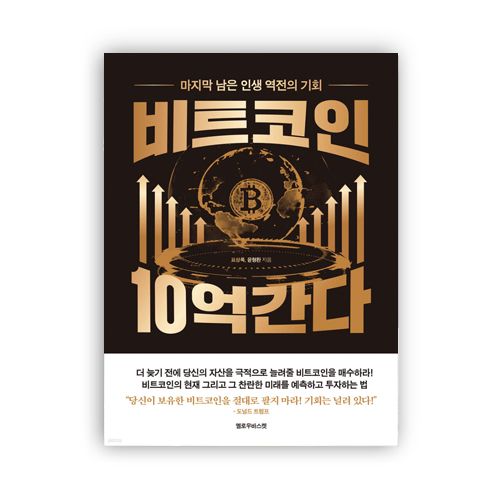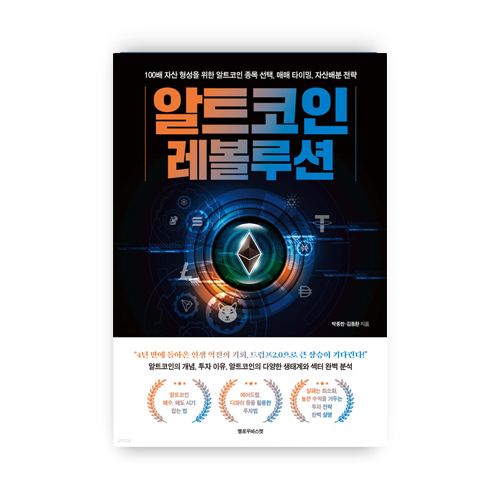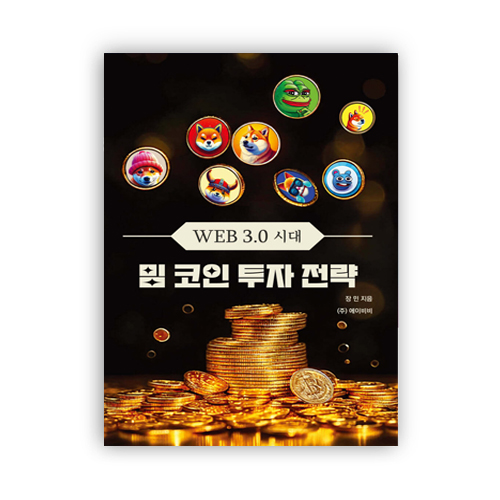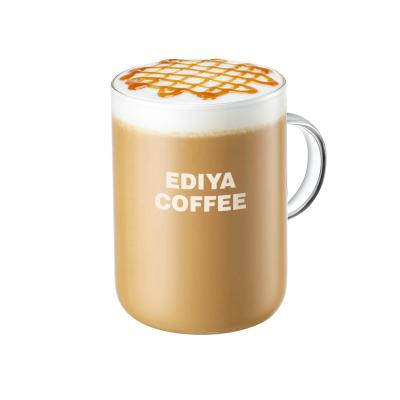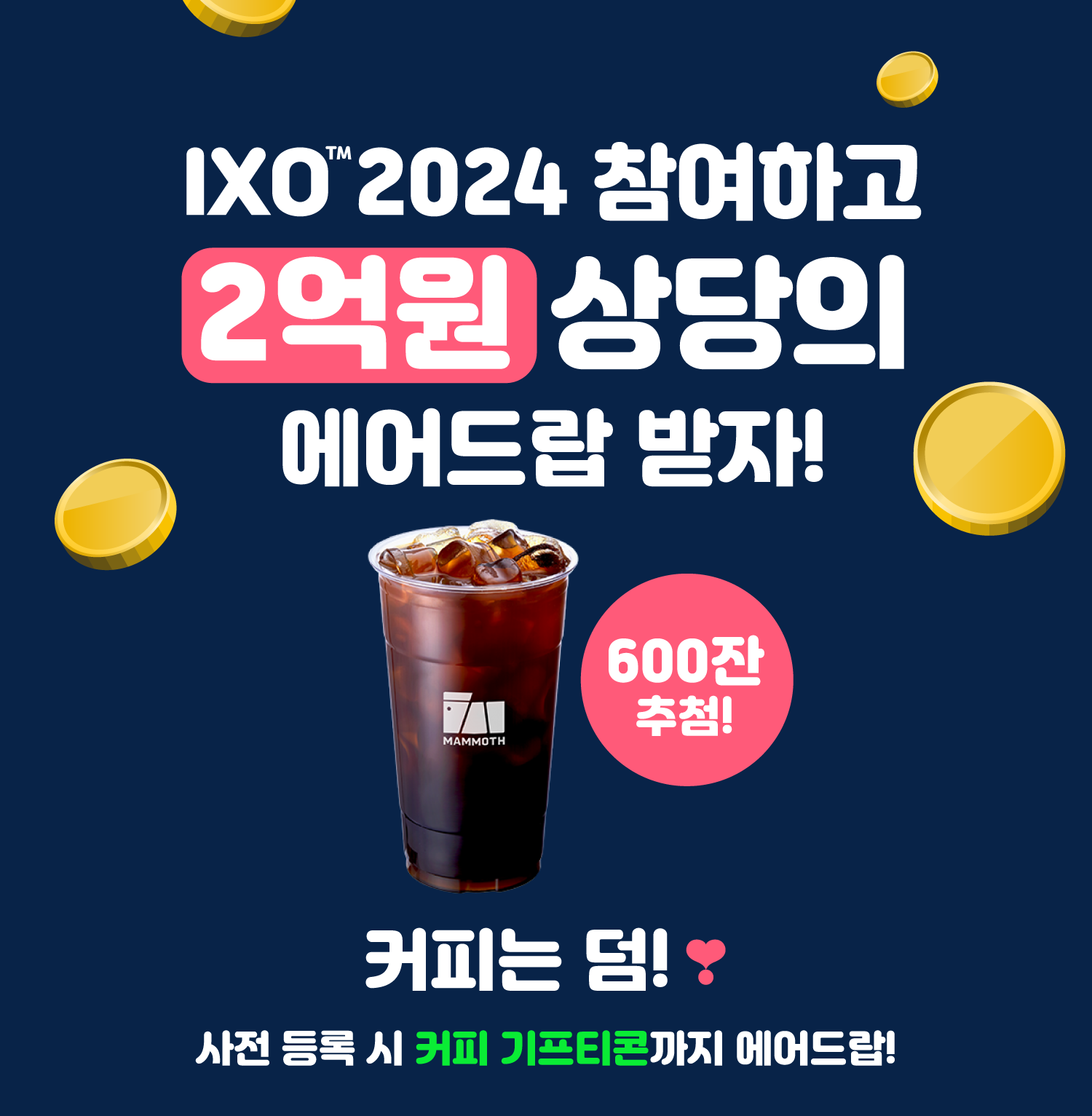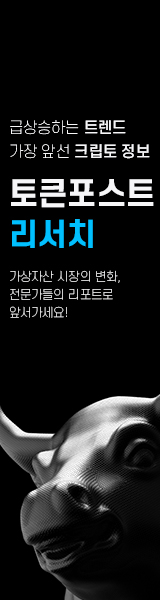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방안이 경제학자 및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과 의문을 낳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 제품에 장벽을 마련한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관세율 산정 방식은 무역수지 적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관세는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10% 세율을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일부엔 더 높은 세율을 매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 산정에 있어 미국과 각국 간 경상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당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교역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역수지를 관세 결정의 중심 근거로 삼는 접근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러큐스 대학교 메리 러블리(Mary Lovely) 교수는 “무역적자가 꼭 불공정무역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상호주의'라는 표현은 실체와 다르며 오히려 문제를 혼동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책적 명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실제 관세 적용 방식은 일부 동맹국에게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20%, 일본에 24%의 고율관세를 부과했으나, 상대적으로 긴장이 높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는 오히려 10%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심지어 미국이 2024년 기준 약 17억 5,5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호주에도 동일한 10% 세율이 적용돼 논란이 됐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수지가 반드시 불균형 또는 부당한 무역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캐나다가 미국에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구조는 비관세 장벽 때문이 아니라 값싼 수력전기를 활용한 비교 우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자유무역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자국 생산보다 효율적인 타국 생산이 무역흑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실질적 압력이기보다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거시전략 총괄 짐 리드(Jim Reid)는 “시장이 이 관세들이 실효성이 낮으며 결국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했다.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겨냥한 채 전략 없이 단기 충격만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수개월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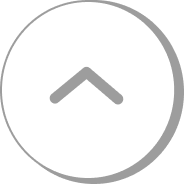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