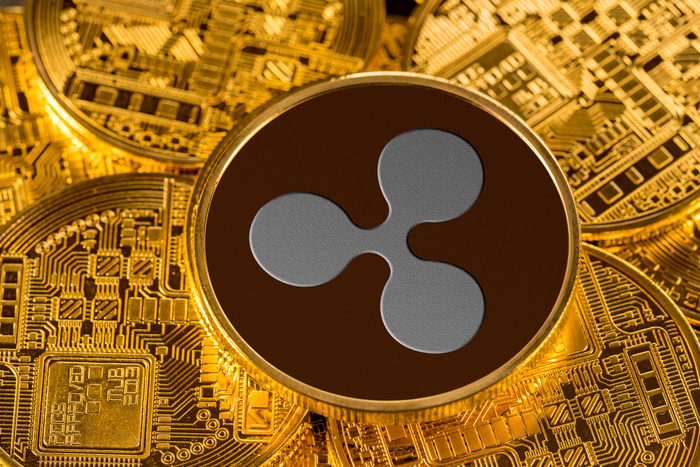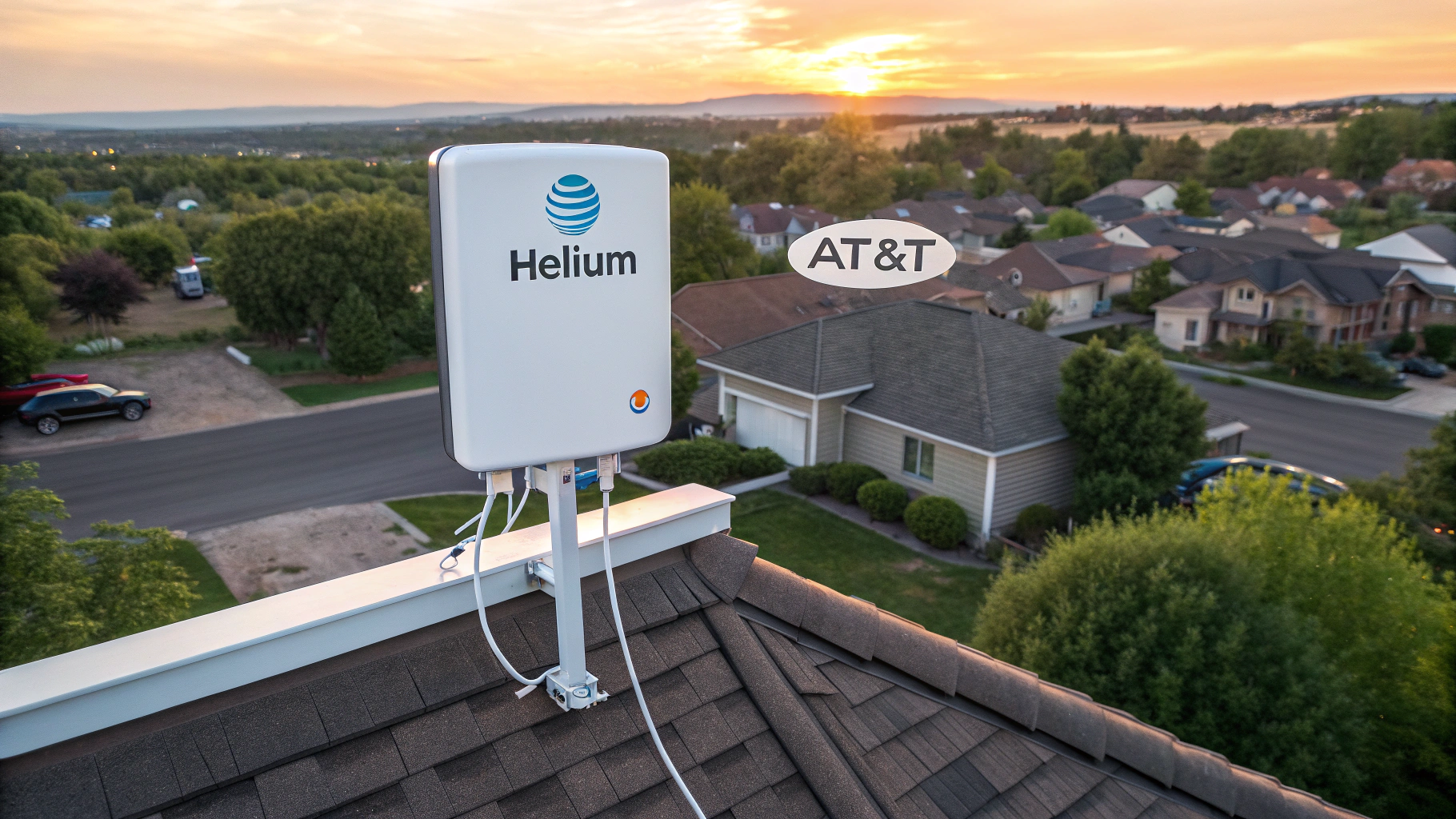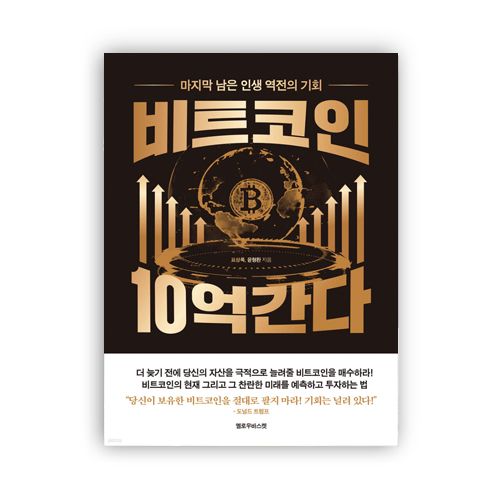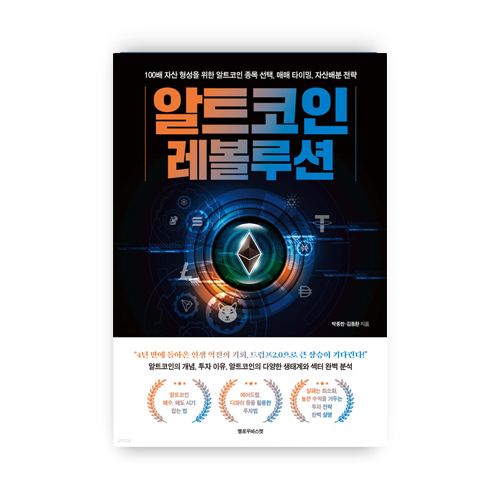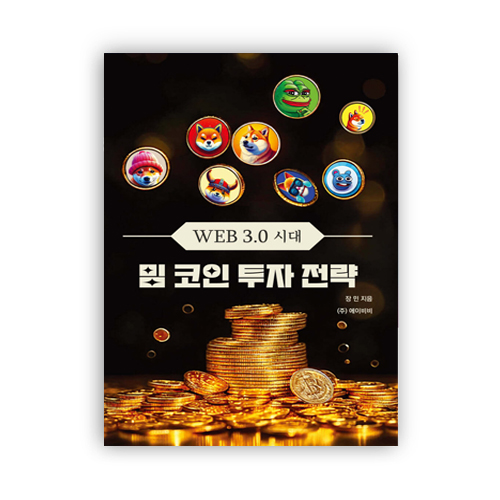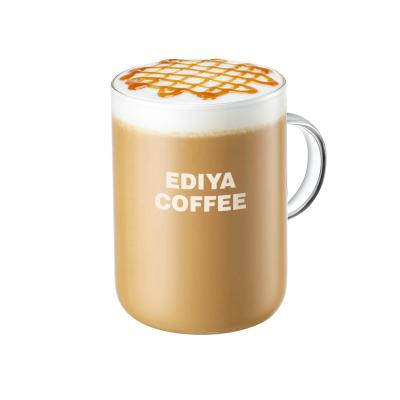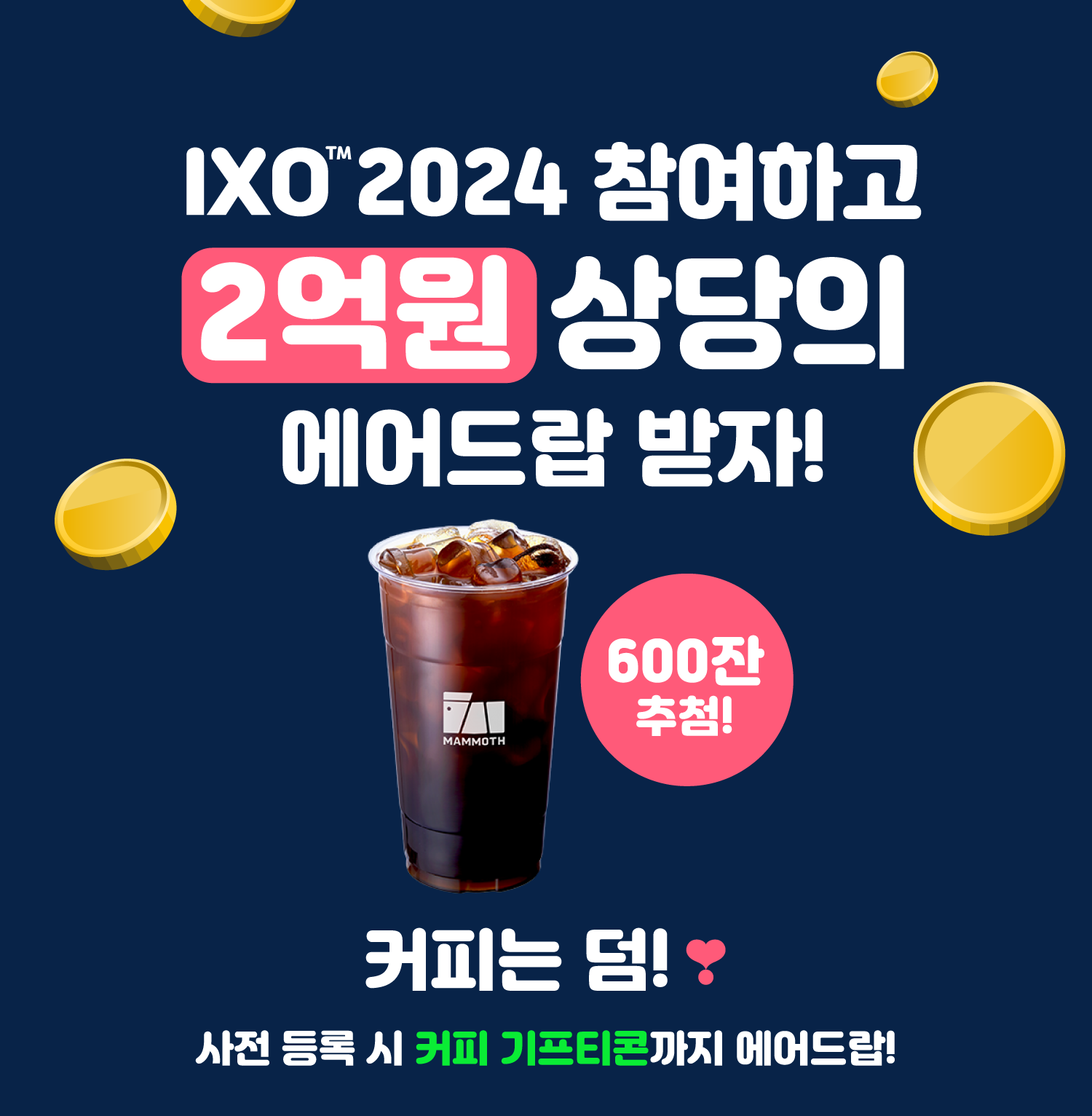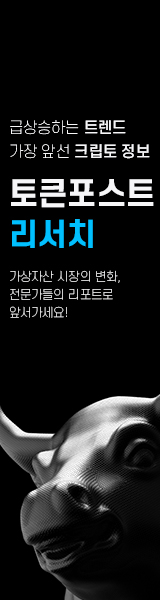KYC(고객신원확인)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YC는 금융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돼 점차 강화돼 왔다. 1970년 미국에서 ‘은행비밀법(BSA)’이 제정되면서 대규모 현금 거래 보고가 의무화됐고, 이후 9·11 테러를 계기로 고객 식별 프로그램(CIP)이 도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유럽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KYC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중앙화 거래소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 주소 증명 등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KYC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유출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파이(DeFi) 영역에서는 기존 KYC 방식이 탈중앙화라는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알고리즘 기반 신원 검증’, ‘제로 지식 증명(ZKP)’과 같은 암호학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 요건만 증명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온체인 평판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화 거래소와 기존 금융권에서는 KYC 규제가 필수적이지만, 디파이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규제 모델이 자리 잡을 경우,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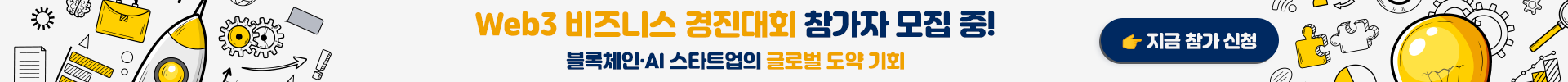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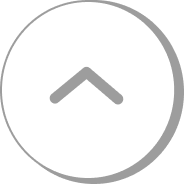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