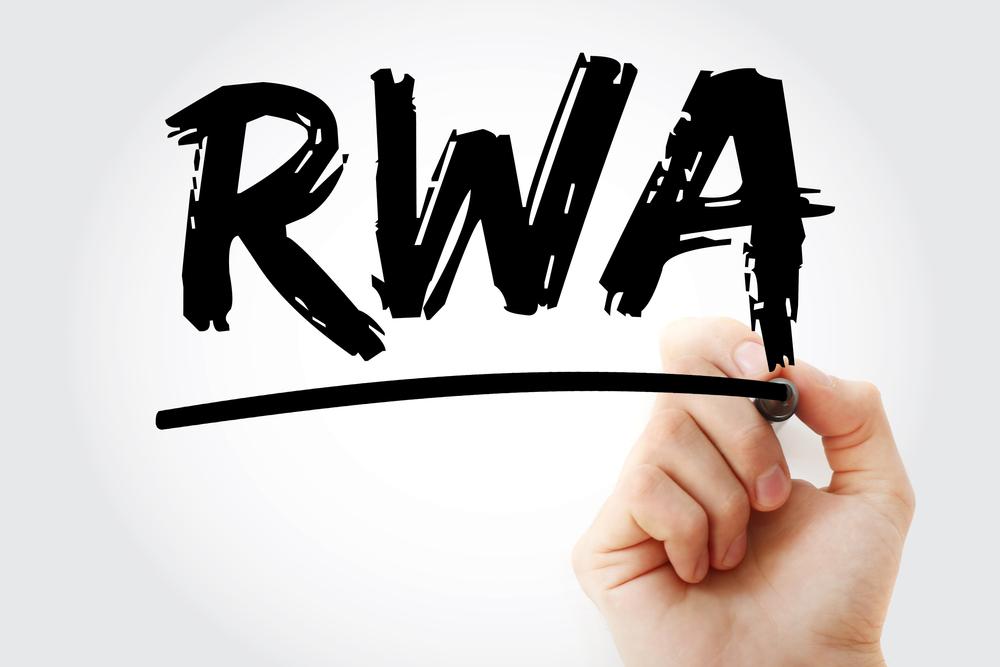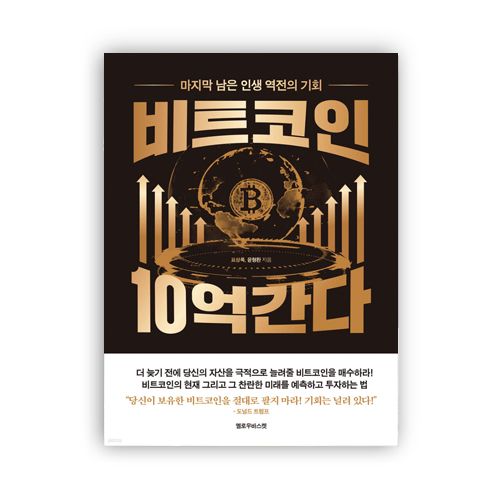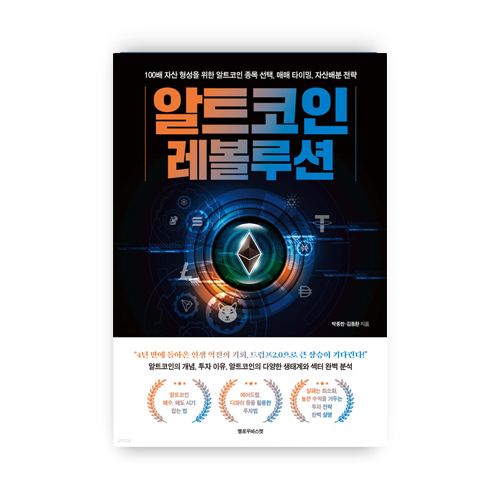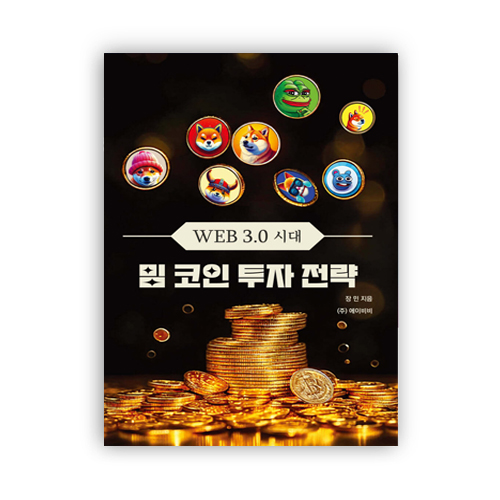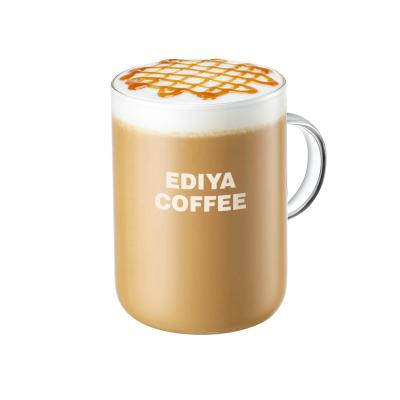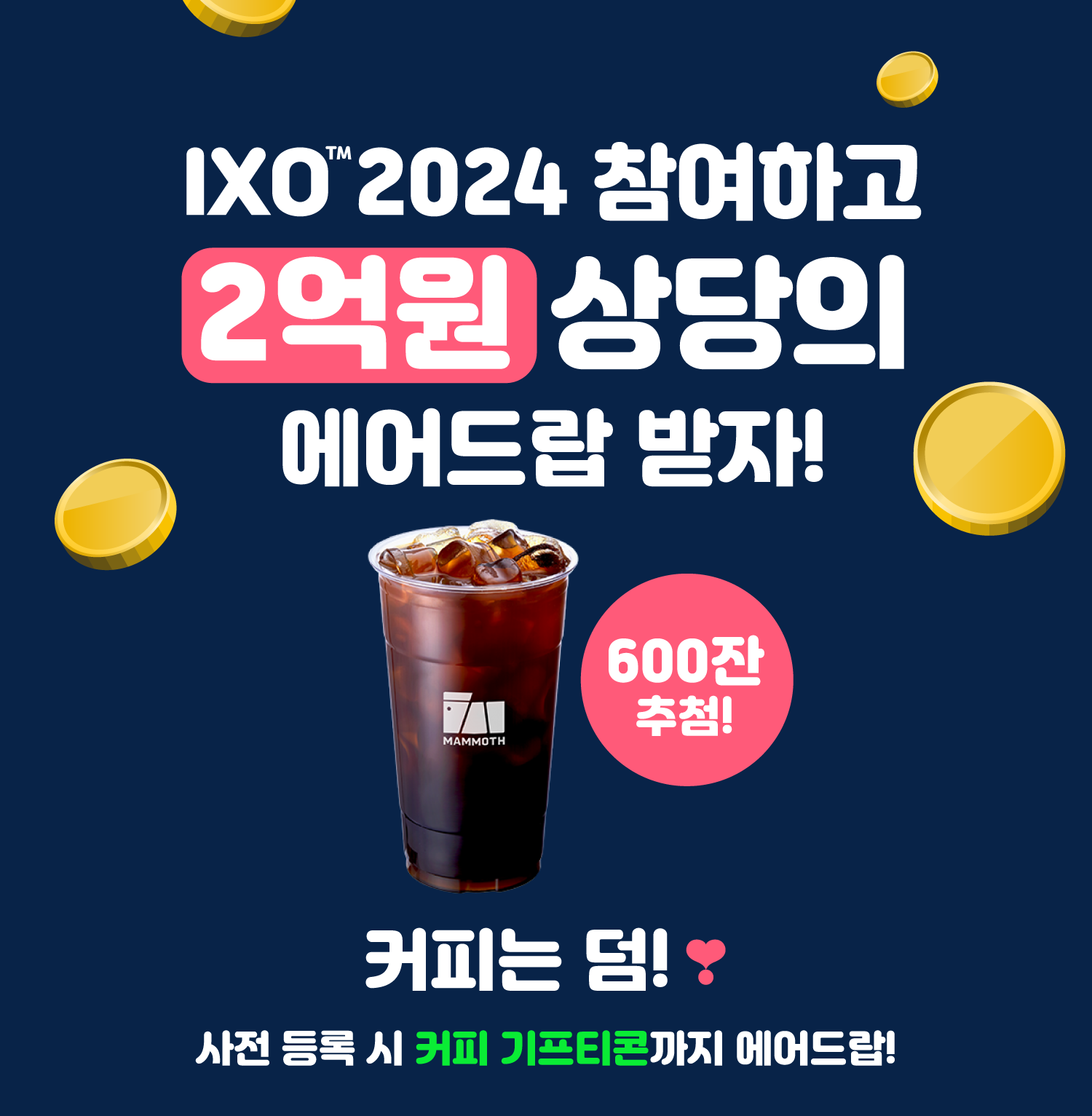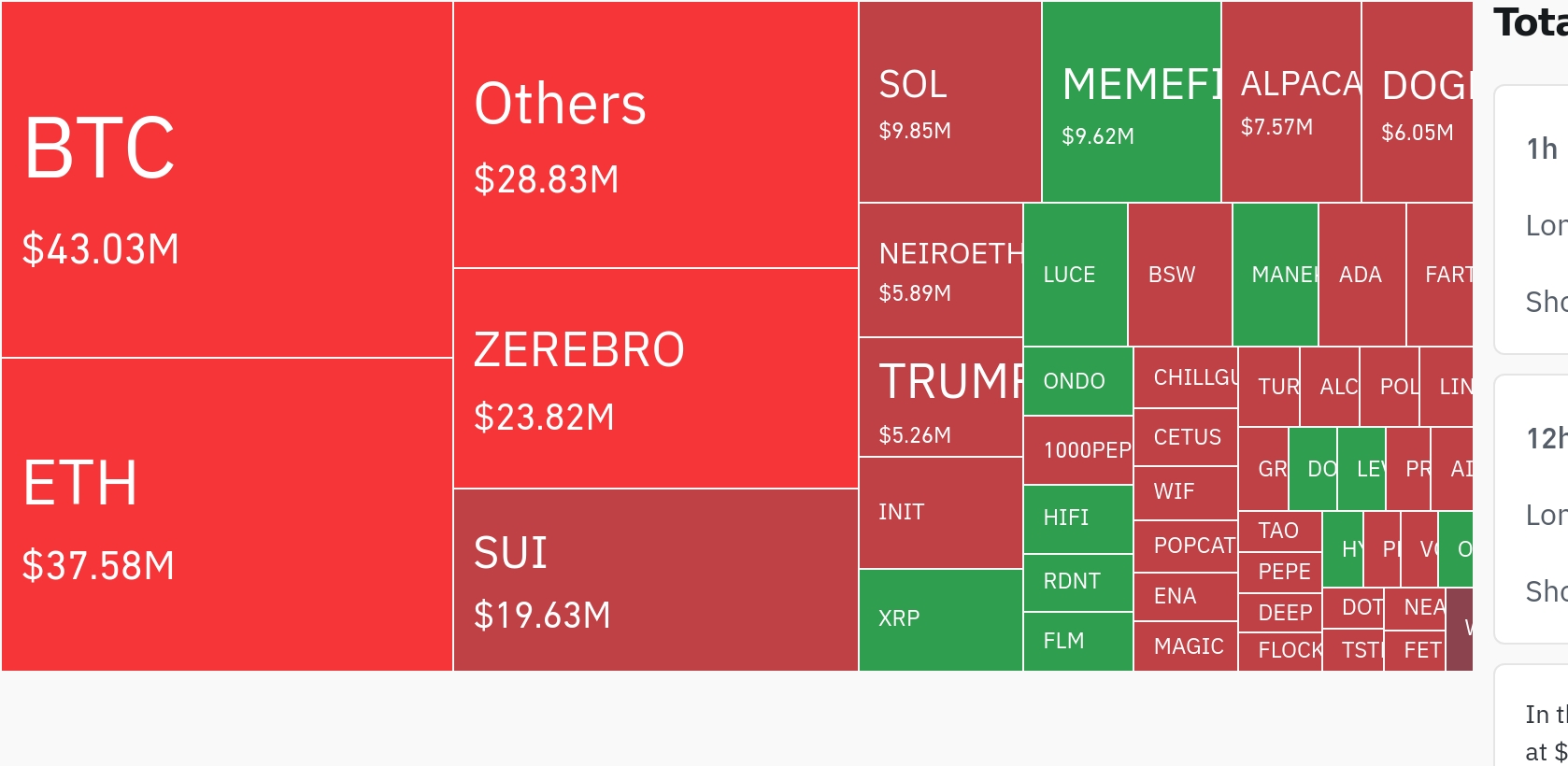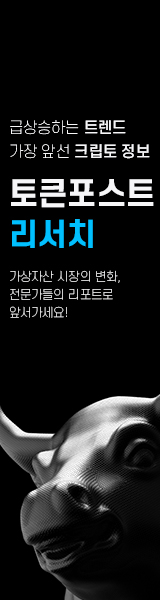폴리곤 랩스(Polygon Labs)의 마크 보이런(Marc Boiron) CEO가 디파이(DeFi) 생태계 전반에 걸쳐 유동성 관리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디파이 시장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자초한 문제라고 날을 세우며, 토큰 보상 기반의 고수익 설계가 불안정한 유동성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보이런 CEO는 탈중앙금융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체인 소유 유동성’과 투명한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만 치중하면서, 투자자 충성도 없이 자본만 빌리는 구조였다”며 “이런 방식은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토큰 가격이 하락하면 곧바로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복되는 유동성 공백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중 하나다. 보이런은 “고수익을 앞세운 토큰 인센티브 정책은 결국 자산 가치를 희석시킬 뿐”이라며 “디파이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단기 유동성 유치 대신 내재적인 재무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폴리곤의 새로운 거버넌스 토큰인 POL을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소개했다.
POL은 단순한 보상 수단이 아닌, 생태계 참여자들이 직접 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즉, 외부 유동성 공급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프로토콜 자체가 국고를 통해 유동성을 소유함으로써 자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개념이다. 보이런은 “프로토콜 재정을 활용하면 토큰 발행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질 좋은 재무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다. 그는 “수수료 수취, 채권 기반 모델, 제한적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구축하는 데는 인내와 짜임새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계는 전통금융(TradFi)의 요구조건과도 부합한다. 그는 “기관들은 시장 유동성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 구조를 원한다”며 “디파이가 유동성 급감이나 슬리피지 급등을 반복하면 기업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이런은 이 전략이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는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에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이라며 “건전한 재정 모델이야말로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고 건실한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된 수익성과 유보 자산 확충을 목표로 하는 폴리곤의 전략은 디파이 생태계가 진정한 분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이런은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규제안(MiCA), 미국 정부의 점진적인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계기로 점차 제도권 자금이 디파이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12~18개월 동안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모델이 뒷받침되면 디파이가 실효성 있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을 내다보며 그는 안정된 디파이 구조와 커뮤니티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실물 자산과 전통금융을 연결하는 고도화된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POL은 자본 효율성뿐 아니라 사용자 유치와 참여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며 “단기적 휘발성에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역량 축적과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런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만이 살아남는다.” 그는 매번 시장 사이클이 반복될 때도 살아남는 프로토콜은 철저한 기본기 위에 세워진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팀들이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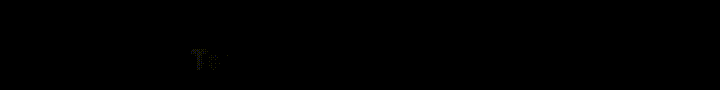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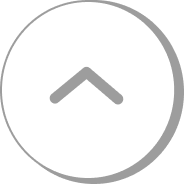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