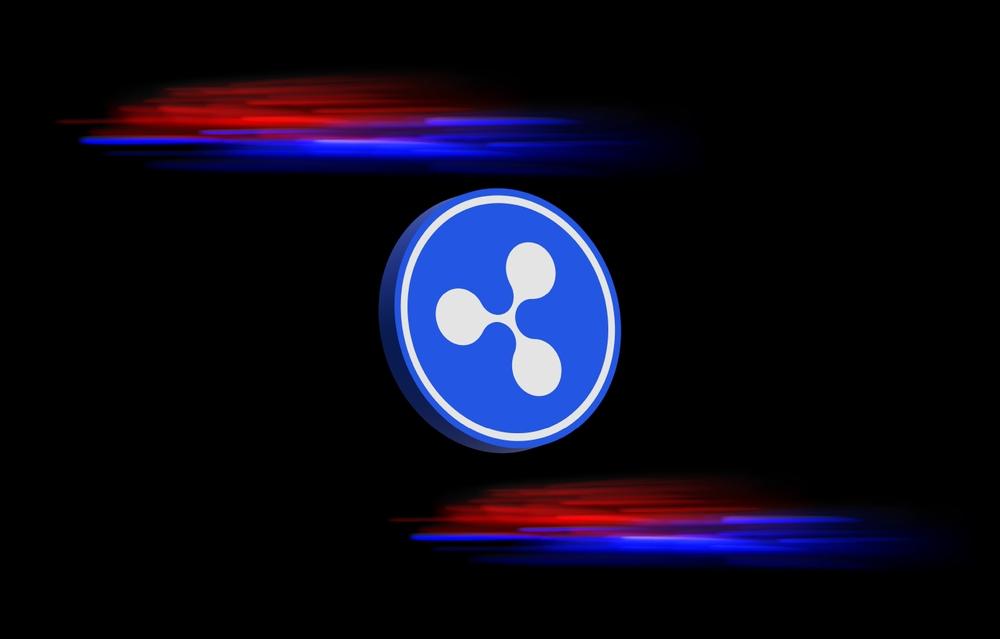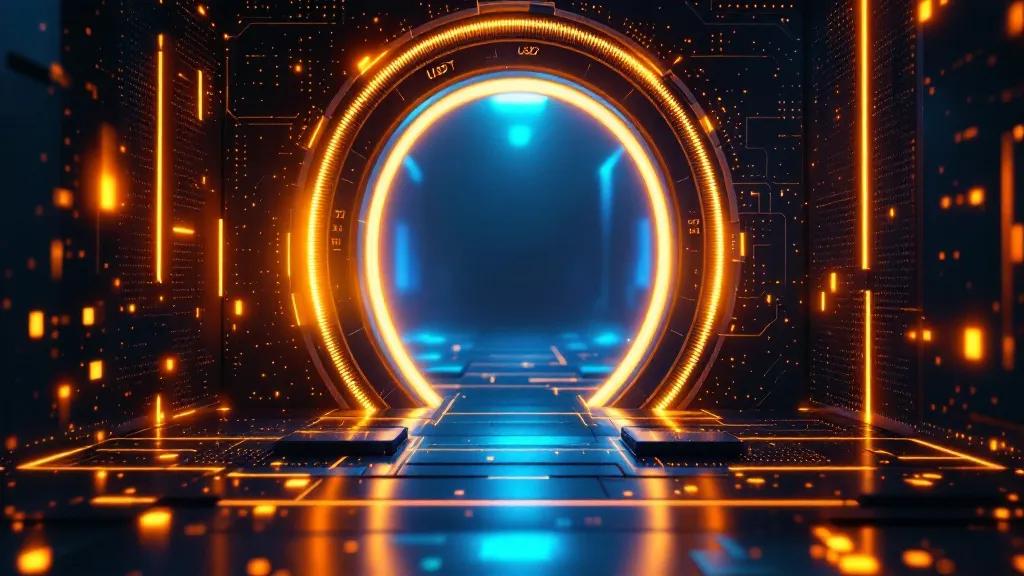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은 종종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비교한다. 그들에게는 블록체인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모습이 1990년대 초 온 세상이 인터넷에 흥분하던 때와 너무나 똑같아서 기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199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 하나가 자신은 ‘인터넷’이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특강을 여름 내내 들었다고 했다. 컴퓨터와 상관없는 간호학을 전공하던 그 친구는 자신에게는 생소한 유닉스(UNIX)라는 언어를 배우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내게 인터넷은 (당시에 유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대충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때도 컴퓨터 간 통신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PC 통신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다루는 포럼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인터넷에 대해 신나게 전도하고 다니던 친구들에 따르면 인터넷이란 단순한 PC 통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한다’는 데 대한 환상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구 위의 속도와 거리에만 익숙한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든 것처럼, 특정 기술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한 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벗어나 있으면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닉스 운영체계를 배우느라 여름 한철을 보낸 친구가 몇 달 뒤 내게 다시 인터넷 이야기를 하면서 “야, 괜한 헛고생했다. 이제 월드와이드웹을 사용하면 인터넷을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한탄했다.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개념이 일반인에게는 같은 말처럼 돌아다니던 시절이었다. 그 친구가 인터넷을 배우려고 고생했던 이유는 자기 전공인 간호학과 관련된 논문을 쉽게 찾으려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인터넷’은 웹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가 전부였다.
훗날 모바일앱이 등장하고, IoT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단순히 월드와이드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체감하기 전까지, 대중에게 인터넷은 그저 컴퓨터 화면에 뜬 브라우저를 의미했고, 전문적인 유저들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학습도 90년대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중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해한다. 당장 내가 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의 등락이 중요하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가 어떤 것인지가 당장 먹고 사는 데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초에도 인터넷은 웹브라우저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때도 당장 웹서핑을 하는 데 필요 없는 인터넷의 탄생과 원리, 잠재력을 설명하는 책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종이책에서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인터넷에 대해 읽고 배우는 게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세상 그 누구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고, 누구나 유치한 수준의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암호화폐, 그 이후』(애덤 로스타인, 반비)는 90년대 초에 내가 인터넷에 대해 읽었을 법한 책의 블록체인 버전이다. 1장에서 비트코인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시작해 마지막 장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끝나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암호화(encryption)나 복호화(decryption)처럼 다소 생소한 개념들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90년대의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당시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개념들의 번역, 한글화 시도가 있었다. 번역어와 영어 표현 중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다).
다행인 점은 우선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등장하지 않았기에 90년대의 인터넷처럼 외계기술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당시 책들에 비해 훨씬 친절하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법을 아는 저자가 썼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End of Money: The story of bitcoin, cryptocurrencies and the blockchain revolution’이고, 아마존 페이지에서는 ‘청부살인, 마약운반, 횡령, 돈세탁. 마치 스릴러물의 플롯처럼 들리는 이 단어들은 암호화폐의 짧은 역사에 등장하는 실화’라고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미국식 홍보를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짜릿한 이야기만으로 가득한 책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 지루한 기술 책이 아닌 건 맞다.
특히 챕터의 스토리라인에 병행해서 등장하는 푸른색 박스(원래 기술서를 읽는 재미의 상당 부분은 이런 자투리 얘기를 읽는 데서 오는 법이다) 속에는 전문가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걸 듣다 말고 우리가 “근데 잠깐, 무식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하고 물을 만한 질문과 답을 모아두었다.
박스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거래 가변성 문제’나 ‘해외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와 같은 꽤 기술적인 질문부터 ‘비트코인이 공짜로 생긴 학생들은 이것을 어디에 썼을까’ 같은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질문, 그리고 ‘그래서 화폐는 돈인가, 아닌가’ 같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까지 다양하다. 그 질문과 답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그냥 이 책을 쓰기 위해 리서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만큼 질문들이 다양하고, 하나같이 궁금한 내용들이다.
심지어 박스 글에 넣지 못한 것들을 책 뒤에 ‘50개의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따로 모아두기까지 했다. 비트코인의 중심지부터 관련된 문학작품까지(그중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는 내가 예전부터 읽겠다고 다짐만 하고 e북 리더에서 잠자고 있는 책이다) 모아둔 것을 보고 저자가 이 주제에 대해 가진 관심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을 번역한 홍성욱은 우연히도 내가 지난해 읽었던 두 권의 책,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과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저자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지만 활발한 저술 작업과 성의 있는 번역이 눈에 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알기 위해 책을 딱 한 권 읽을 만큼의 관심을 가진 분들이나,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읽으려고 하는데 우선 좋은 출발점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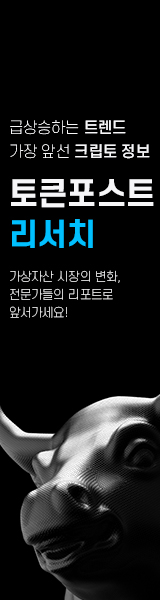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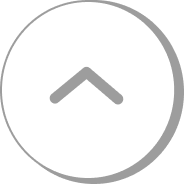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