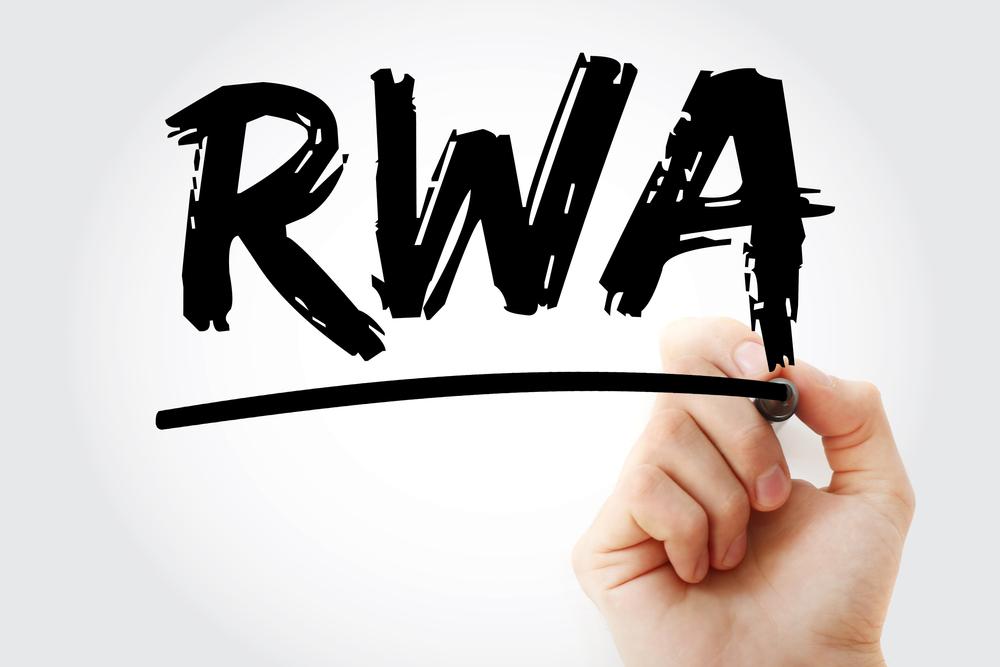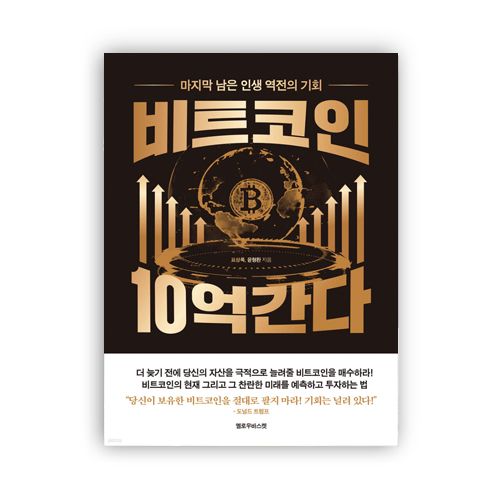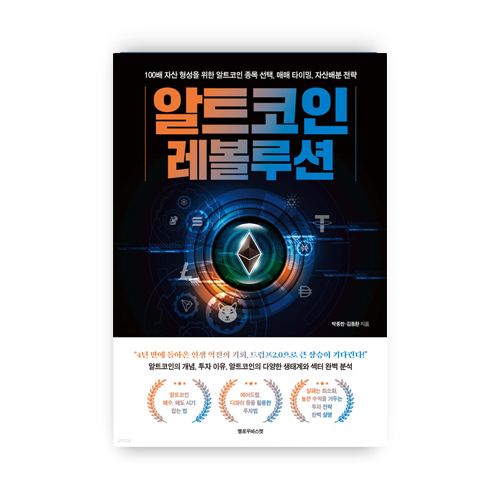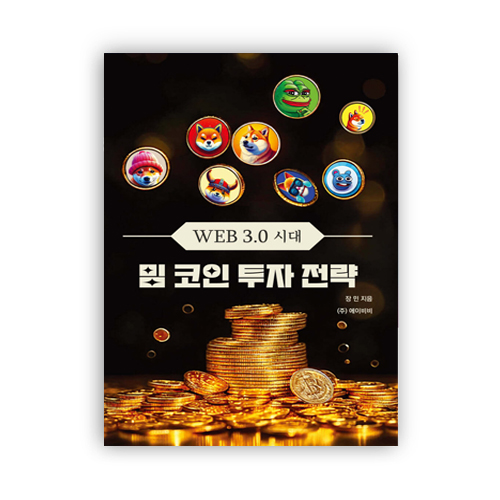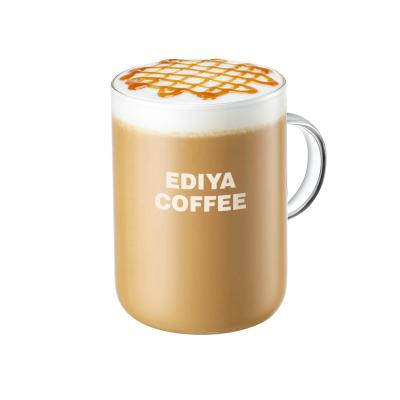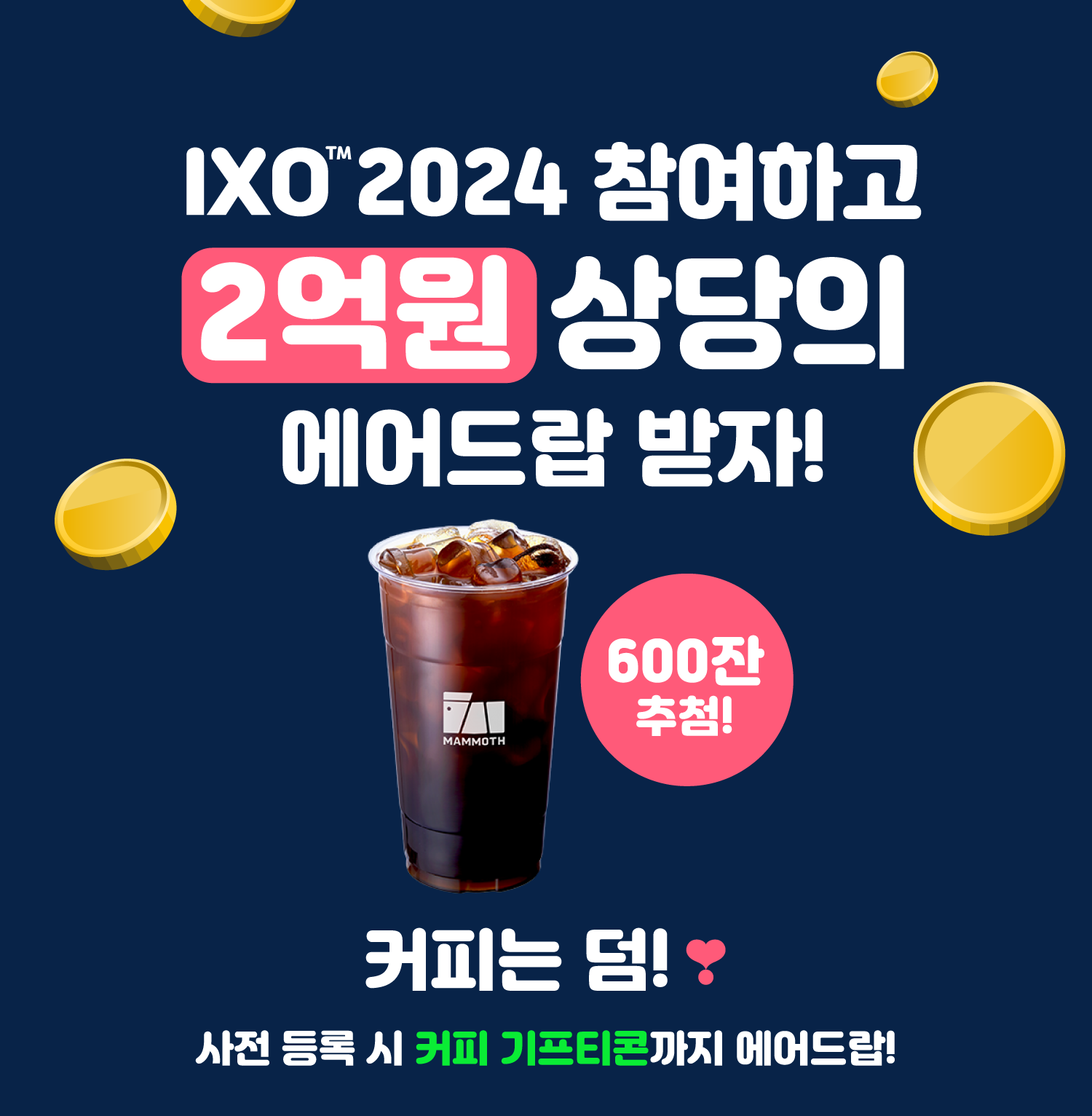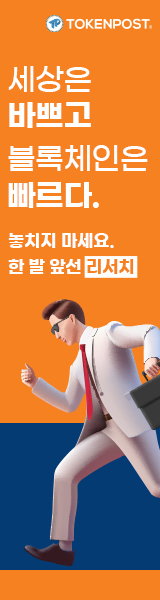비트코인이 국가 차원의 준비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채택되는 과정이며, 이는 필연적이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기업 얀3(Jan3)의 최고경영자(CEO)인 샘슨 모우(Samson Mow)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국가와 기관이 이를 보유하려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역시 이 같은 채택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첫 거래 이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조차도 비트코인을 금에 비견되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주요 기업들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퀀텀 이코노믹스(Quantum Economics)의 설립자인 매티 그린스펀(Mati Greenspan)은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국가적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자산을 축적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그의 원래 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미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커뮤니티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비트멕스(BitMEX)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는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도구로 삼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량 보유자가 시장을 조작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하드웨어 지갑 업체 트레저(Trezor)의 분석가 루시앙 부르동(Lucien Bourdon)은 "국가 수준의 비트코인 보유는 중앙집중화가 아니라 신뢰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라며 "이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강력한 통화적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비트코인이 개인, 기관, 국가 모두에게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려면, 어떤 단체도 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유지돼야 한다. 비트코인의 국가적 채택이 본래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 흐름에 맞춰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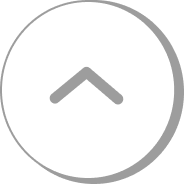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