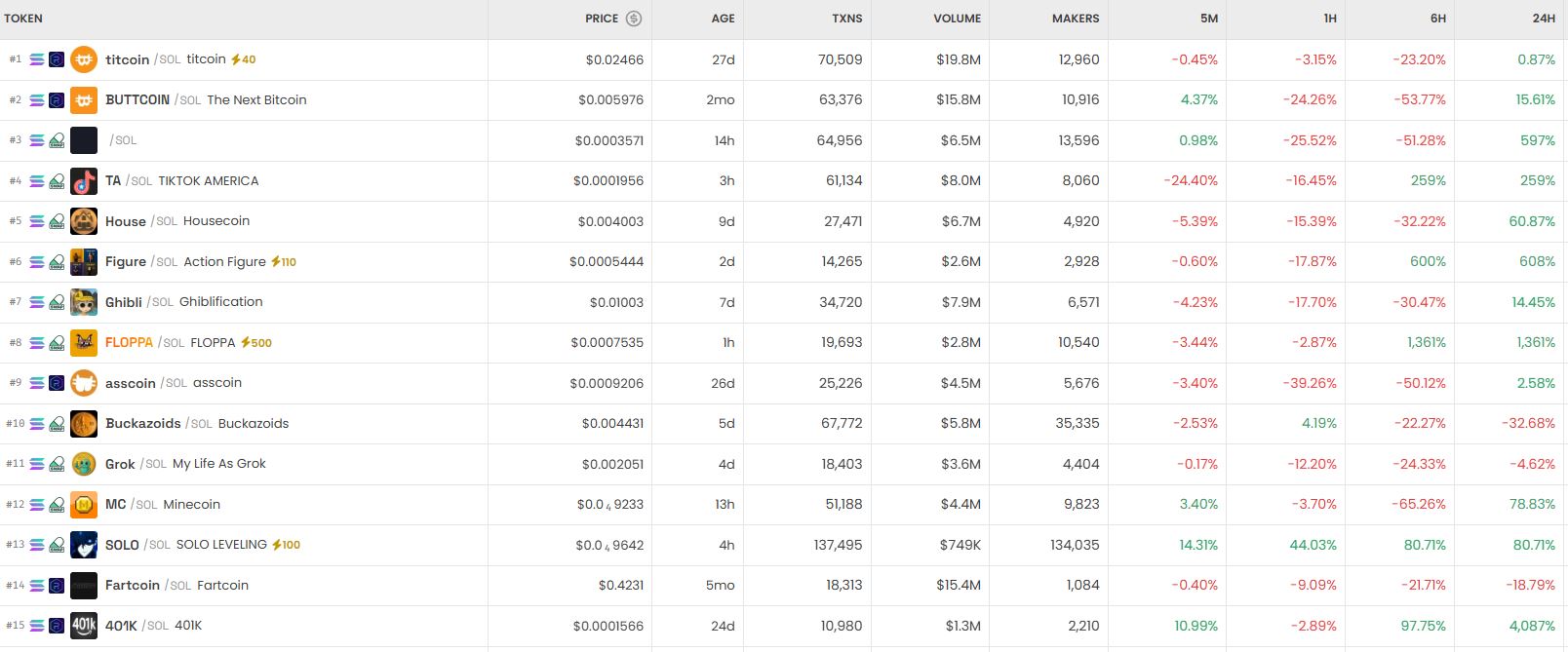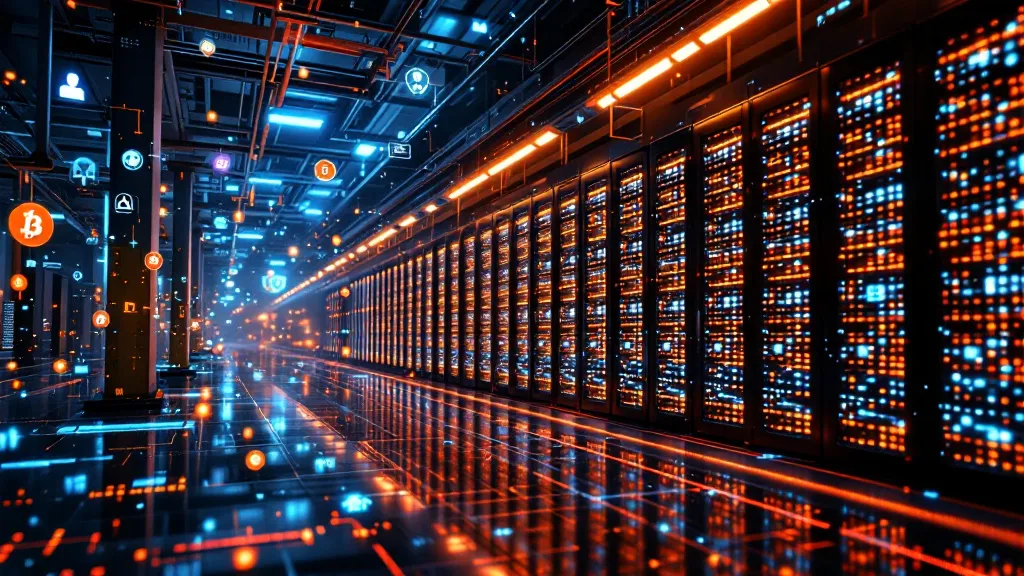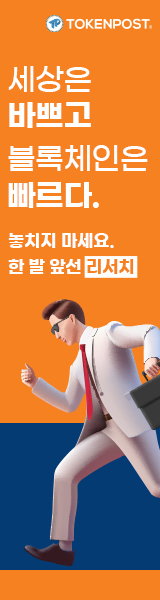스튜디오 지브리를 모방한 인공지능(AI) 창작물이 저작권 법률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계 전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 톱 랭커 테니스 선수 자클린 크리스티안이 SNS에 올린 팬 아트 이미지가 한창 논란 중심에 섰다. 얼핏 보면 공식 지브리 작품처럼 보이는 이 일러스트는 사실 AI가 만들어낸 것으로,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스튜디오 지브리처럼 고유하고 상징적인 예술 스타일까지 AI가 흉내 내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에, 기존의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모델이 특정 작품을 직접적으로 복제하진 않았더라도, 수많은 지브리 이미지로 훈련된 시스템이 유사한 분위기와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사실상 창작성 자체를 무단 활용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작품이 창작되는 즉시 보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스타일” 자체에 대한 보호는 부재하다. 이는 AI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이다. 법적으로는 직접 복제가 아닌 이상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예술적 독창성을 보호하자는 법의 본래 목적과는 괴리된다.
AI 창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이나 개인이 굳이 전문 작가를 고용하지 않고도 지브리풍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작가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창작 효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실제 지브리 작품인지 혼동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곧 상표권 침해로 번질 수 있으며, 지브리 브랜드의 정통성을 해칠 수 있다. 저작권이 원작 보호라면, 상표권은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는 법적 장치다. 이런 상황에서 AI 이미지는 소비자 신뢰를 허무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
현행 법은 AI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창작 데이터 학습 시 사전 동의 의무,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조건 명확화, 그리고 스타일 보호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브리 사태는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AI는 이미 음악, 문학, 디자인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인간의 창작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 창작 자체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기술이 창조 행위를 흉내 내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작자의 고유권은 점차 무력화되고 창작의 인센티브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AI를 금기시하지 않더라도, 창작 영역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장치 확립은 필수적이다. 지금 이 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모든 예술은 기계가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독창성은 더 이상 예술의 기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AI에게 허용된 자유는 인간의 창작 의지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창작과 기술 간 균형을 다시 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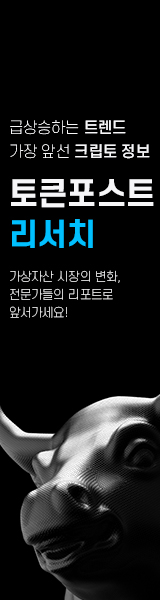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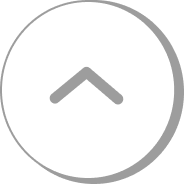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