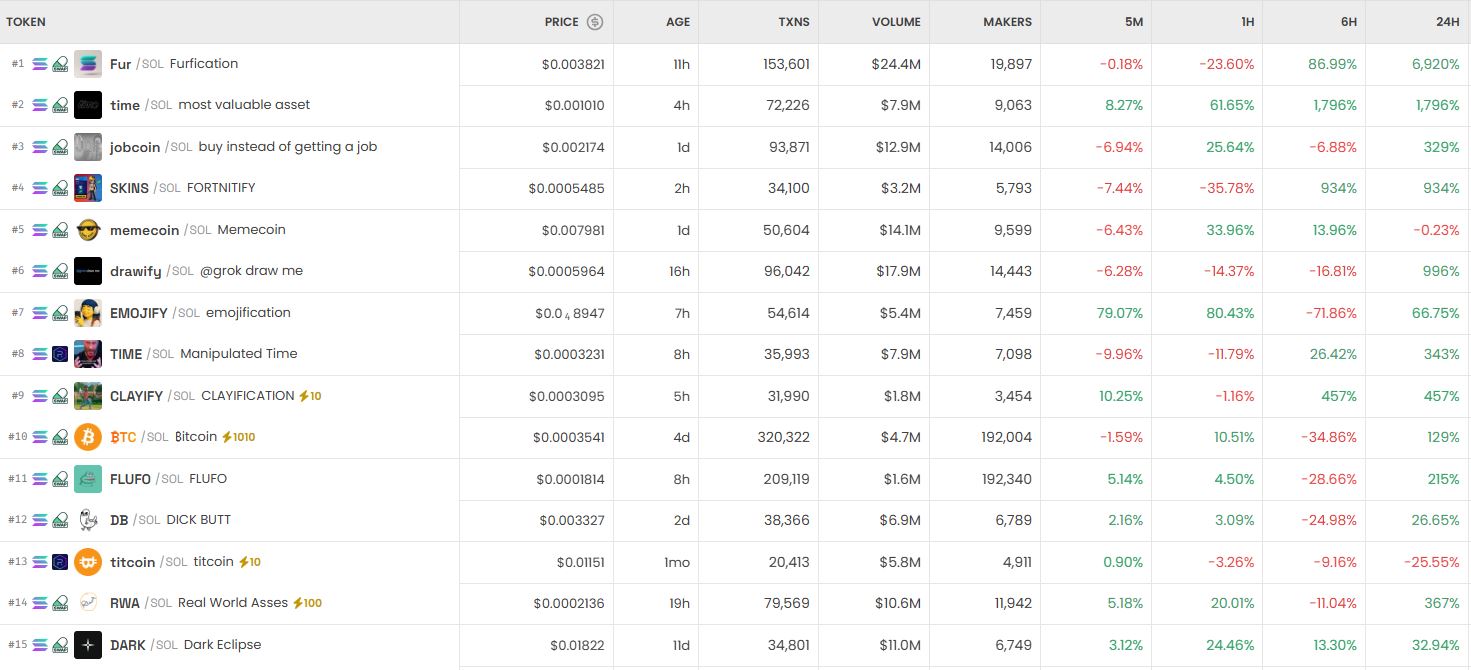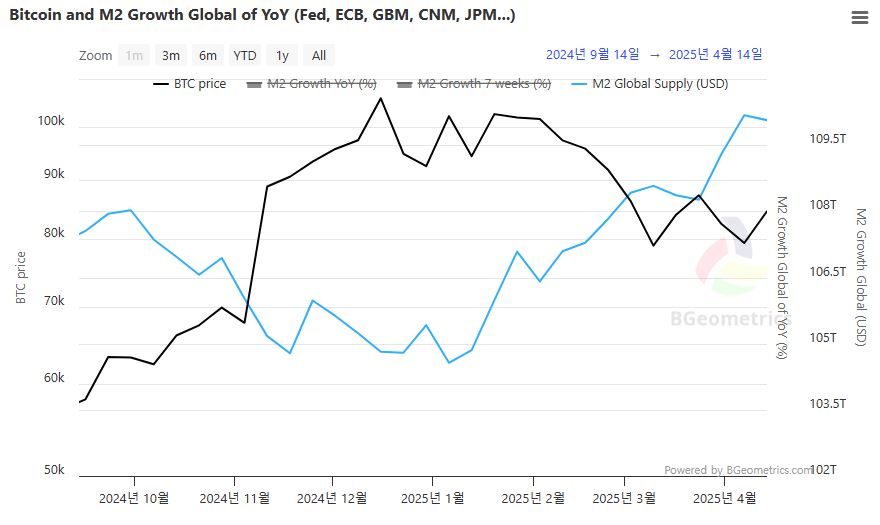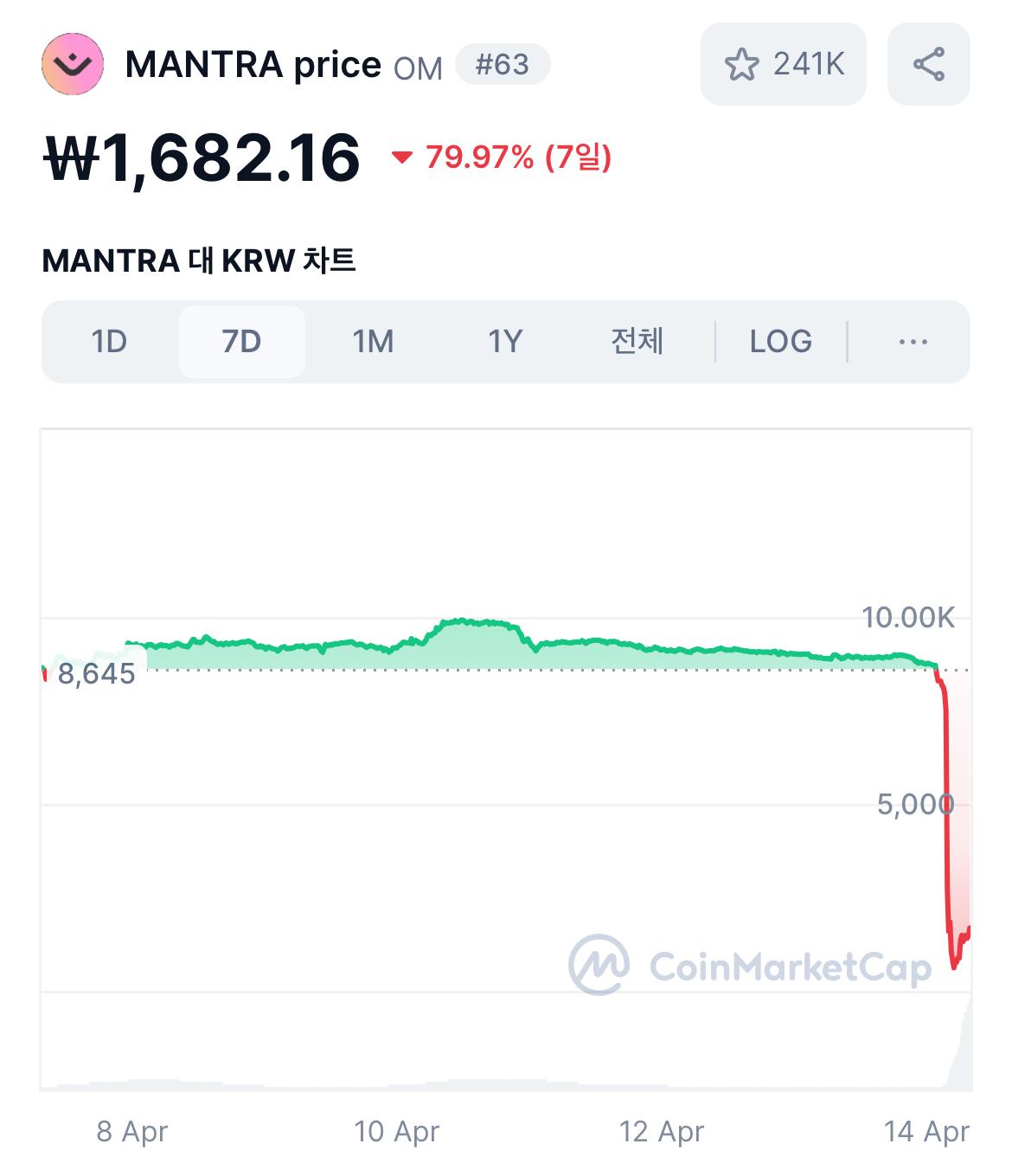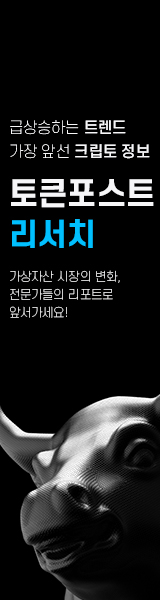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학생 대출 제도의 민영화를 시사하면서 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그는 교육부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때 대형 은행 규모에 달하는 1조 6,000억 달러(약 2,304조 원) 규모의 연방 학생 부채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교육부는 ‘은행이 아닌 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소기업청(SBA)으로 연방 학생대출의 관리 권한을 이관할 뜻을 밝혀 연방 대출 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현재 연방 학생 대출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민간 금융기관이 정부 보증을 받아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였고, 일부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이 시기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FFEL(연방 가족 교육 대출) 프로그램이며, 이 구조 아래에서 학자금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제공되되 연방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했다. 이 방식은 정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제시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민영화가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차입자의 상환 책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현재 연방 학생 대출 프로그램은 2021 회계연도 기준 1,970억 달러(약 283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정부에 안기고 있다. 이에 민간금융을 통한 대출 회귀는 재정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보고서를 통해 민영화가 고등교육 시장에서 실효성이 낮은 학위나 기관에 대한 선택을 억제하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영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거대한 대출 규모를 민간 금융기관들이 모두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다. 학자금 대출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츠는 "심지어 기존 대출 자산을 50% 할인해도 민간 금융권은 이를 감당할 자본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 자산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한 연방 보증 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해져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상환 유예, 탕감, 소득 기반 상환 등의 유연한 프로그램도 대부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소득 또는 취약 계층 차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 접근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중심적 개편이라는 가치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적 구조의 변경에는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장벽이 존재한다. 학생 대출 시스템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 교육의 경계에서 지속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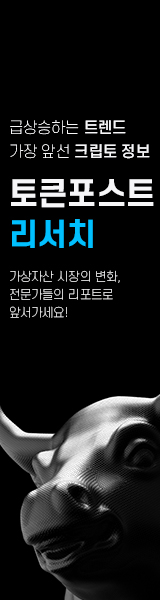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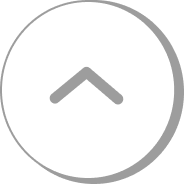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