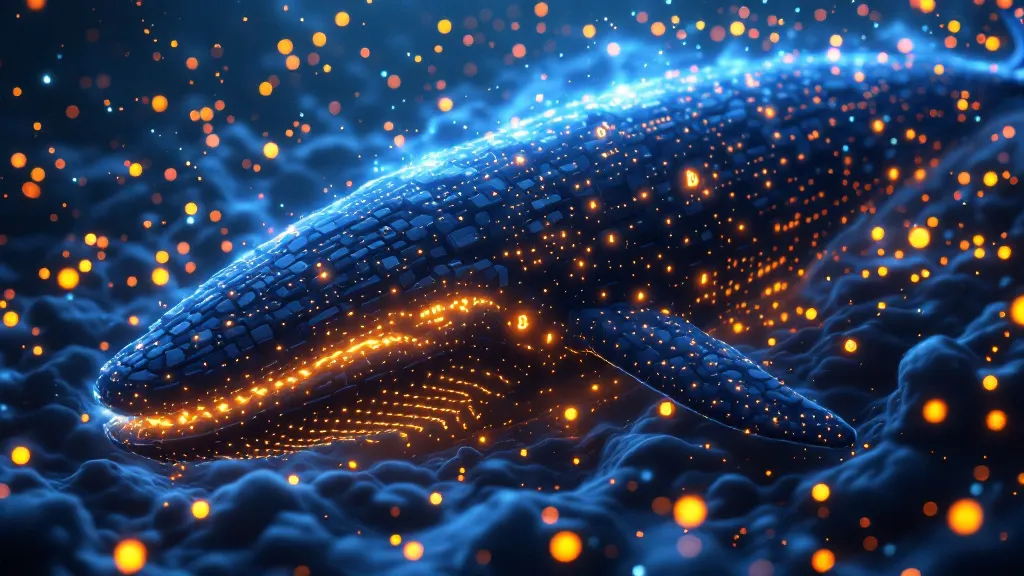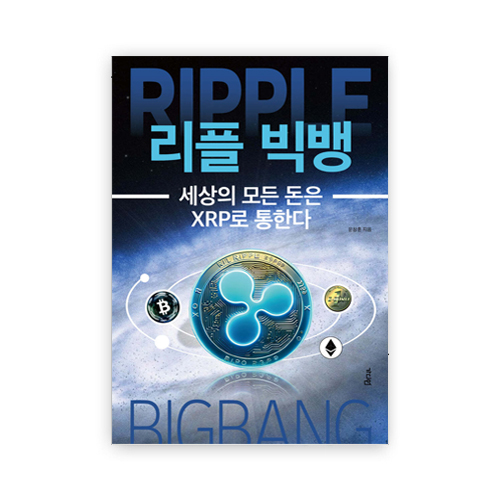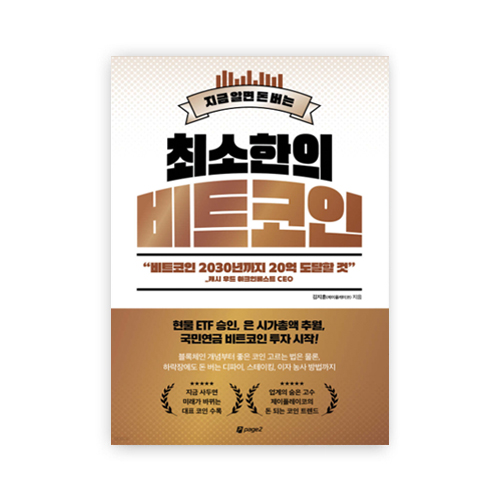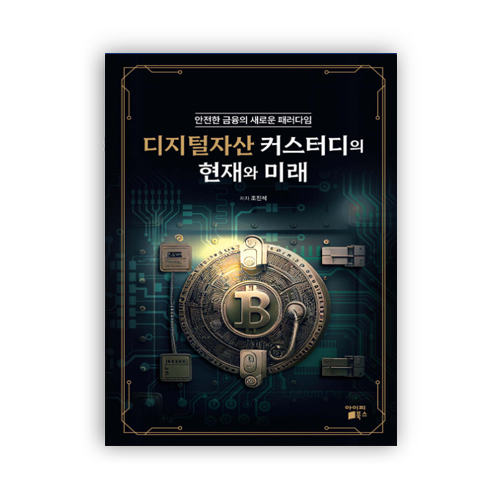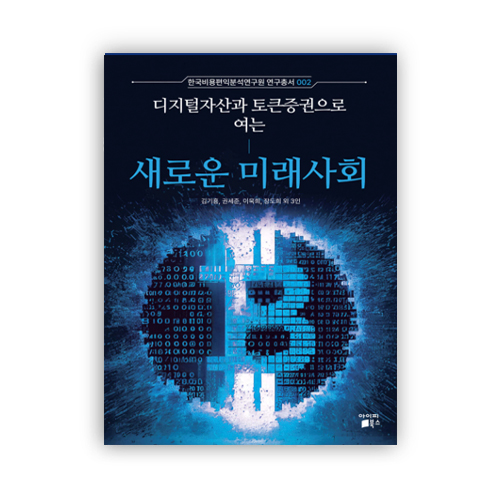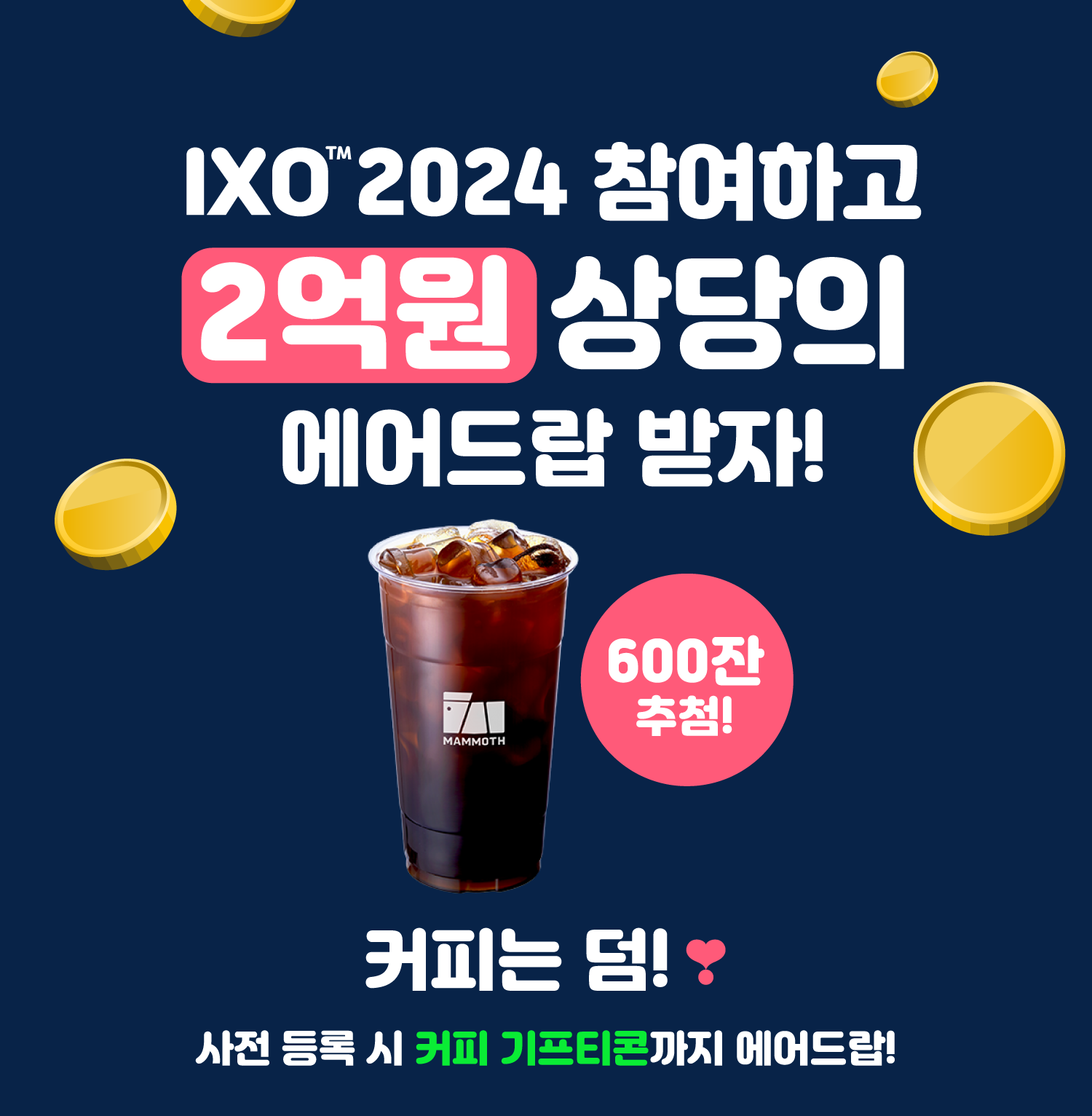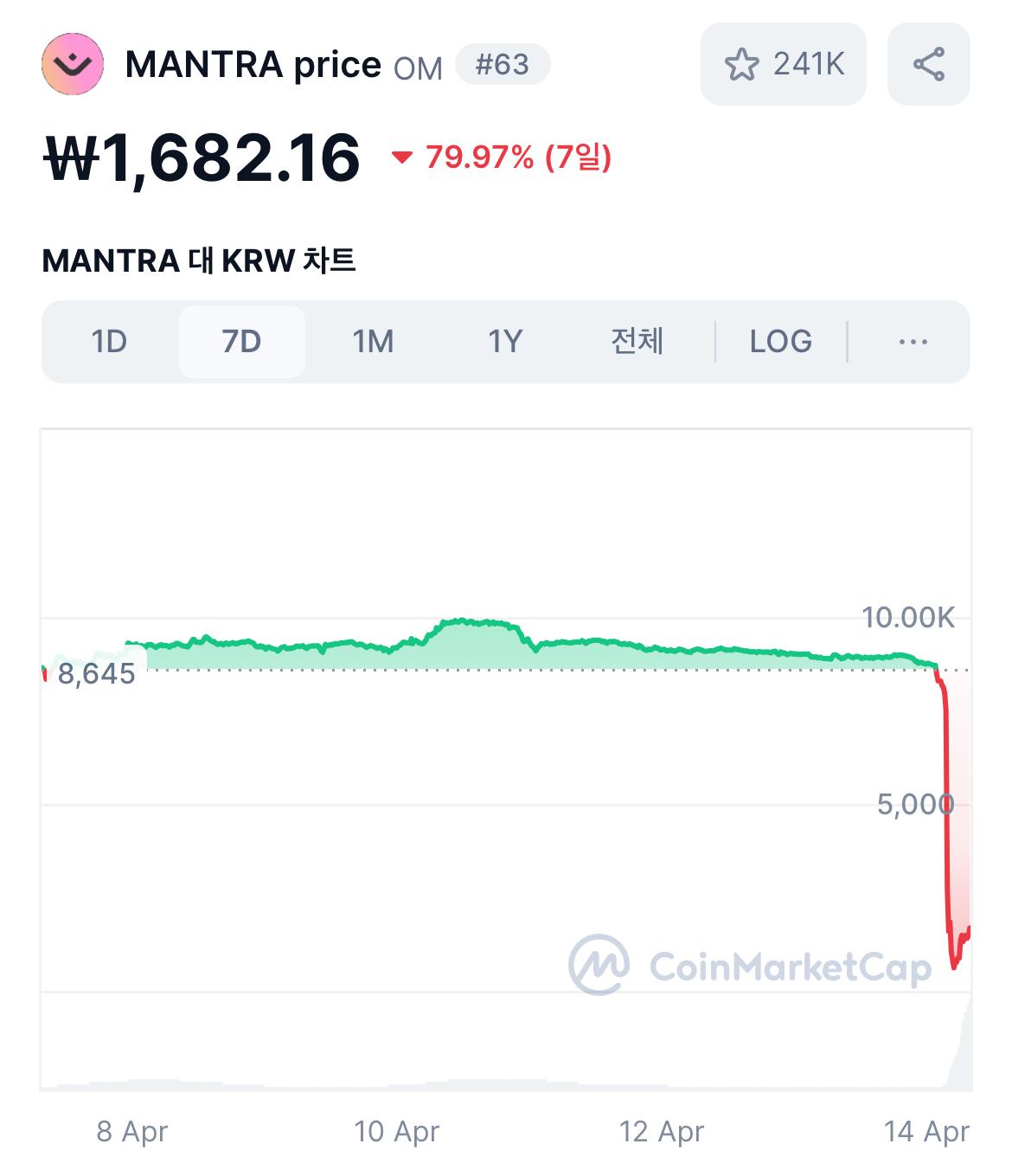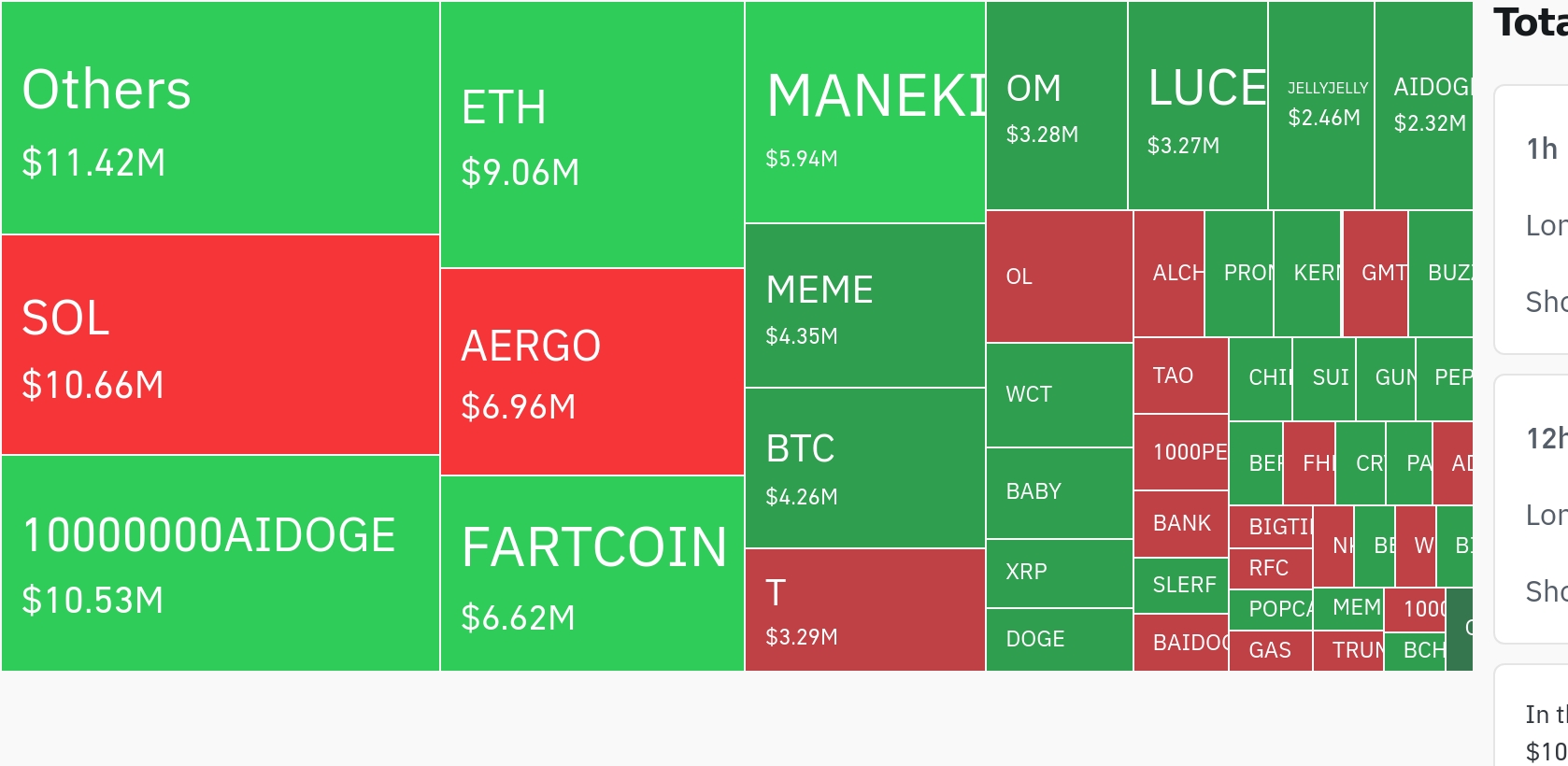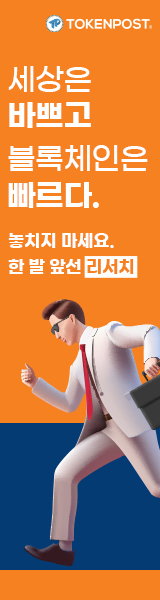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 앱을 중심으로 금융 포용성을 확산하려 애써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 명이 금융 시스템 밖에 머물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택률은 8%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분산화와 접근성 확대를 내세웠던 이상은, 현금 중심의 일상에 의존하는 수십억 인구의 현실을 철저히 간과해온 셈이다.
특히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현금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생존 수단이다. 은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낮으며, 디지털 문해력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터넷 연결과 앱 사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은 이들 지역의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오프라인 암호화폐 솔루션이 시험 도입될 때마다 채택률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은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진입 경로가 없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용 니즈는 존재하지만 업계의 접근 방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현금 의존이 단기간에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거래의 76%가 여전히 현금으로 이뤄지지만, 암호화폐 채택률은 14%에 달한다. 모로코 역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16%의 인구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결제의 72%가 현금 기반이고, 인도조차도 63%가 현금 거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공통의 특징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이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력보다도 이 간극을 해소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채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수요 부족이 아니다. 바로, 디지털 지갑이나 온라인 서비스만을 유일한 진입로로 간주하는 업계의 관점이다. 이 같은 시각은 현금 중심의 경제권에서 살아가는 다수 인구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한 데 있다. 물리적 블록체인 연동 지폐, QR 코드 기반 상품권,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금 서비스 등 지역 경제 실정에 맞는 형태로 암호화폐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다른 산업에서 입증된 바 있다. 아프리카의 M-Pesa는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대리점 기반 모델을 통해, 66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유사한 시스템은 암호화폐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본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마찬쿠라(Machankura)’ 서비스가 등장해 1만3600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스마트폰 앱 없이도 가능한 이런 방식이야말로, 복잡한 절차 없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수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재, 진정한 금융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수십억 명에 달하는 현금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야말로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을 앞당길 핵심 열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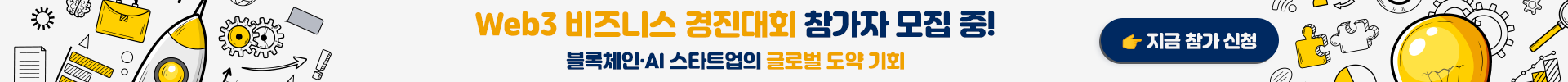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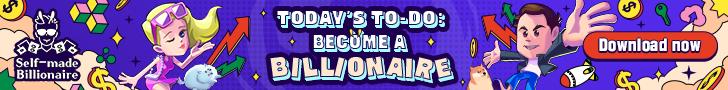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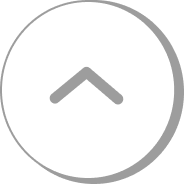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2
2